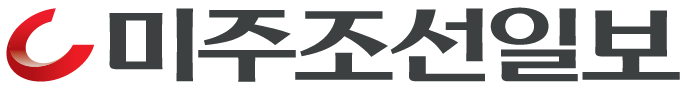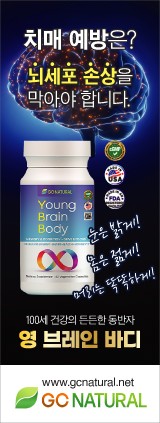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크리스천 칼럼]도마를 바라보다 울컥했던 순간

한남옥 (시인, 수필가, 영락교회 은퇴권사)
가끔은 너무 오래 곁에 있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다.
늘 손에 닿고 눈앞에 있으면서도,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날 나는 부엌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오래 함께해 온 한 존재를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감자 샐러드를 자주 만든다. 남편이 좋아하기도 하고, 만들어 두면 빵에 넣어 먹거나 반찬으로 곁들이기에도 좋다. 오이와 당근, 양파와 양배추를 잘게 썰어 소금에 잠시 재워 두고, 감자와 계란은 푹 삶아 익힌다.
소금에 절인 채소는 면보에 올려 물기를 꼭 짜내고, 감자는 으깨고, 삶은 계란은 다른 재료와 크기를 맞춰 다진다. 그 위에 마요네즈를 넣어 조심스럽게 버무리면 하얀 감자살 사이로 초록과 주황빛이 보석처럼 스며든 부드러운 샐러드 한 그릇이 완성된다.
그런데 그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는 한 자리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다.
재료 하나도 도마를 거치지 않고 지나간 것은 없었다. 오이가 지나가고, 당근이 지나가고, 양파가 지나가고….
칼 끝이 닿을 때마다 도마 위에는 미세한 흔적이 하나씩 더해졌다. 그 흠집들은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 오래된 것들이 뒤섞여 겹겹이 패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아무렇지 않게 재료를 올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칼을 움직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날 만큼은 달랐다. 도마 위를 오래 바라보는 동안 미지근한 슬픔과 조용한 감사가 함께 피어올랐다. 이 많은 칼질과 무게를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감당해 온 존재가 바로 이 도마라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단단한 결을 지녔다는 이유로 선택된 나무 한 장.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모든 일이 시작되는 자리. 잘려 나간 단면들이 다시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는 자리. 누군가의 식탁 위에 따뜻한 한 끼가 오르기까지 가장 먼저 상처를 받아내는 자리.
나는 도마 위 깊은 흠집들을 바라보다가 잠시 칼을 내려놓았다. 그 자국들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품은 기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문득 우리 곁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 온 사람들. 집 안에서, 일터에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티 나지 않게 흠집을 받아 내며 하루를 떠받쳐 온 사람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조용히 버텨 준 이들 말이다.
샐러드 한 그릇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재료가 지나갔던 길을 떠올리며 나는 도마 위를 천천히 닦았다. 깊게 패인 흠집마다 인사를 건네듯 손을 쓸어 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한 마디를 올려 두었다.
“고맙다.”
그 한 단어가 한동안 부엌의 공기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