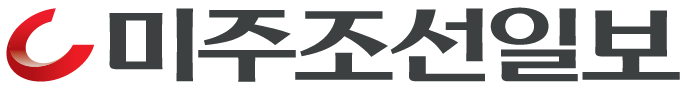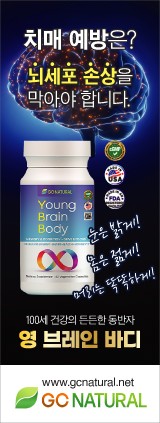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기독교 인문학]희망을 향하여 함께 가자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
세월은 쉼 없이 흘러 어느덧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오늘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놓여 있고, 한때 안정의 상징이던 미국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 보인다.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거센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현실 앞에서 새해를 희망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떠오르는 문학 작품들이 있다. 먼저 양귀자의 소설 ‘희망’이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나성여관’을 배경으로 사회에서 밀려나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여관 주인의 아들 전우연은 대학 입학을 포기한 대입 3수생으로 절망 그 자체의 인물이다. 그는 여관에 머무는 패배자들과 위로를 나누며, 타인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깊은 아픔을 치유하고 마침내 희망을 발견한다. 절망 한복판에서 길어 올린 희망이다.
중국의 대표 작가 루쉰의 '고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낯설게 변해버린 고향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나지만, 친구는 그를 ‘나으리’라 부른다. 관계마저 단절된 현실 속에서 루쉰은 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도 함께 걸을 때 길이 생기고, 그 길이 곧 희망이 된다는 통찰이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시내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 작은 저항은 거대한 연대로 확산됐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등을 중심으로 381일간의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이어졌다. 결국 인종차별 철폐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함께 걸을 때 길이 열렸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복구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 속에서도 123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수년 만에 해수욕장이 다시 열리고 생태계는 회복됐다. 함께한 발걸음이 희망의 길을 만들었다.
1857년 미국 경제공황 시기, 절망이 사회를 뒤덮고 있을 때 제레미야 란피어는 뉴욕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기도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기도의 불길은 점차 번져 6개월 만에 매일 정오 1만 명이 모이는 기도 운동으로 확산됐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희망은 현실이 됐다.
성경 속 이야기 또한 이를 말해준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 식량이 끊기고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성문 앞에 있던 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큰 군대의 진군 소리로 들리게 하셨고,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해 도망쳤다. 함께 나아가자 희망의 문이 열렸다.
초대교회 역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역사의 전환점마다 희망의 길을 열어왔다. 새해를 맞아 남가주 여러 교회가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 남가주 교회협의회 또한 시대를 향한 기도 사역을 준비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절망이 짙을수록 희망은 더 간절해진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비로소 길이 되고 희망이 된다.
새해,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