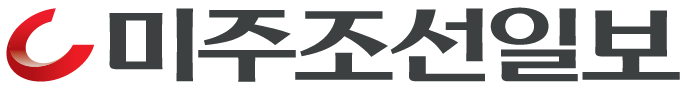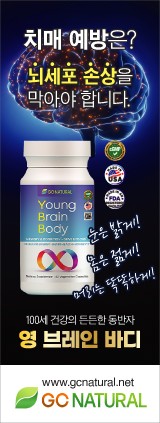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이우근 칼럼] 오만과 위선, 회칠한 무덤
이 우 근 변호사
숙명여대 석좌교수
PEN.KOREA 인권위원장
한쪽은 전통과 안정의 구호를 외치고, 다른 쪽은 개혁과 정의의 깃발을 흔들며 서로 격렬히 부딪친다. 그렇지만 저들의 현실은 그 구호나 깃발과는 전혀 딴판이다. 보수파의 전통과 안정은 폐쇄적 오만으로, 진보파의 개혁과 정의는 자기 합리화의 위선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보수는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변화도 혼란으로 깎아내리고, 사회적 약자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 지난날 경험한 보수의 성취가 현재와 미래에도 마냥 유효할 것이라는 착각이 저들을 국가의 중심세력이라는 오만으로 이끌어간다. 진보파는 도덕적 정당성의 옷을 걸치고 스스로 자유와 정의의 선구자를 자처하지만, 저들 내부의 조직문화는 뜻밖에도 권위적·비민주적이다. 공정성은 대외적 구호일 뿐, 자신들에게는 불공정한 예외를 널리 허용한다. 도덕과 정의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에 불과하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으로 비판을 차단하고, 정의롭다는 연막으로 실체를 가린다. 저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길 따름이다.
보수는 진보를 위선이라고 내치면서 변화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보는 보수를 오만하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도모한다. 국민의 일상적 삶인 일자리·주거·교육·복지는 이념논쟁 탓에 멀찌감치 뒷전으로 밀려난다. 저들이 높이 쌓아가는 바벨탑의 서사(敍事)는 오직 권력쟁취에 초점이 맞춰진다. ‘내가 옳다’는 착각 속에서 보수파는 “우리는 진보파 같은 위선자가 아니다”라고 자위하고, 진보파는 “우리는 보수파처럼 폐쇄적이지 않다”고 변명한다. 서로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도, 성찰하지도 않는다.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보수는 그 전문성을 국민 앞에 매력있는 정책으로 설명해 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수치(數値)는 제시하는데, 비전의 감동은 보이지 않는다. 시대정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대중적 감수성의 결핍 때문이다. 그 상상력의 빈곤과 감수성의 결핍을 엉뚱한 계엄령 따위로 메꿀 수 없다. 보수파는 상상력과 감수성에서 진보파를 따라가지 못한다. 보수의 오만은 무능으로 귀결된다.
인권·평등의 구호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옹호를 부르짖는 진보파는 정의와 도덕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보수파를 특권과 반동의 기득권층으로 몰아붙인다. 이성적 정책보다 감성적 호소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권력게임에 능숙하지만, 도덕과 정의를 정치적 언어로 사용하는 감성정치는 지속적인 정책효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광범위하게 뿌리는 일시적 민생지원금으로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대중의 분노를 앞세워 기득권층을 몰아낸 세력은 곧이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성공한 볼셰비키는 새로운 특권층 노멘클라투라로,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로 변신했다. “마르크시즘은 협력할 동반자를 찾는 대신에 공격할 적을 찾는다.” 칼 포퍼의 비판이다.
나치즘·파시즘·마르크시즘·마오이즘·군국주의·주체사상… 모든 전체주의는 자신을 절대선으로, 반대세력을 절대악으로 규정한다. “좌파는 분노로 폭력시위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남는 것은 분노뿐이다.” 좌파의 선동정치를 꾸짖는 좌파의 이단아 슬라보예 지젝의 탄식이다. 진보의 위선은 기만(欺瞞)이나 다름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보수는 건강하고, 전통에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진보는 참신하다. 한 사회의 중심에는 순수한 정체성이 살아있어야 하지만, 그 주변에는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포용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를 든든히 지키고, 진보는 ‘고쳐야 할 폐습’을 과감히 고치는 것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스스로 먼저 지키는 보수가 진정한 보수요, 고쳐야 할 폐습을 앞장서 먼저 고치는 진보가 진정한 진보다.
보수파가 보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오만, 진보파가 진보의 가치를 조롱하는 위선의 시대… 율법과 도덕의 외투로 거짓의 속살을 감추고 지도층의 자리를 차지한 무리를 예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했다. 오만한 위선자들을 꾸짖는 천둥 같은 울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