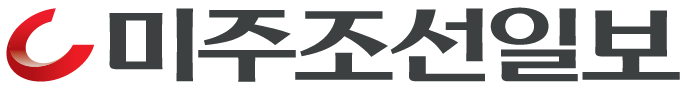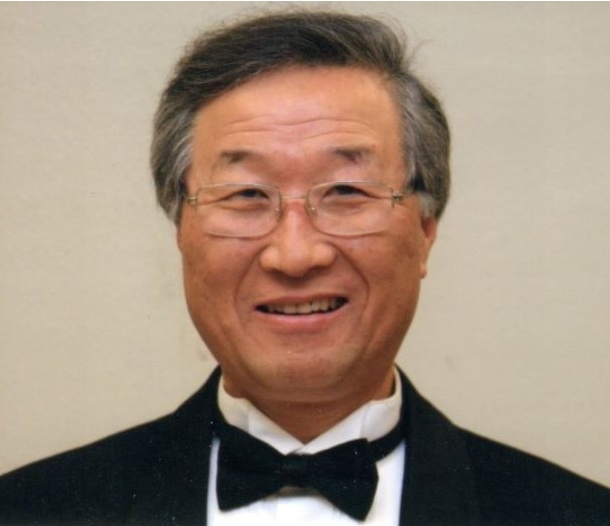[조선 신호등] 11월(November)이 주는 의미
이보영
미주조선일보 독자부 위원
11월은 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환절기의 길목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공간의 색깔이 서서히 바래지듯, 시간 속에도 찬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한다. 한 낮에 피부에 닿는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운데, 바람은 하늘빛처럼 조금씩 더 청정해 진다. 서머타임 해제로 세상 전체가 한 템포 느려진 듯, 그래서일까, 11월은 묘하게 쓸쓸하면서도 분주하다.
‘November’ 라는 달 이름은 아홉(9)을 뜻하는 라틴어 ‘Novem’ 에서 파생되었다. 고대 로마 달력에서 November는 9번째 달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11월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한 해의 끝자락을 미리 내다보는 시간이며, 그것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다. 무엇인가를 끝내야 할듯 하면서도, 끝내기엔 무언가 아쉽고 여운이 남아 있는 시간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들은 계절의 변화를 시어(詩語)처럼 ‘달(月)의 이름’으로 남겼다. 북미 대평원에 퍼져 살았던 ‘수우(Sioux)’족은 11월을 ‘잎사귀가 모두 떨어져 나무가 야위는 달’ 이라 불렀다. 뉴멕시코의 리오그란데(Rio Grande) 강가에 살던 ‘푸에블로(Pueblo)’족은 ‘만물을 거둬들이는 달’ 이라 했다. 오클라호마 지역의 ‘키오와(Kiowa)’족은 11월을 ‘기러기 날아가는 달’ 이라 불렀고, 미네소타주의 ‘아라파호(Arapaho)’족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이라고 표현했다.
모든 것이 스러져 가고, 눈 덮힌 계절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다’고 느꼈다. 잎은 떨어지고 들판은 비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씨 같은 온기가 하나쯤은 남아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11월은 슬픔의 달이 아니라, ‘기억과 감사의 달’이었다.
음력을 사용한 우리 조상들에게 11월은 ‘동짓달’ 이었다.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가 있는 달이며, 이 날은 팥죽을 먹는다. 붉은 팥이 잡귀를 쫓는다고 생각했으며, 또 팥죽을 통해 겨울철 영양을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추수를 마무리하고 김장을 담그며, 땔감을 모으고, 두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던 때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온 가족들은 아랫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냈다. 11월은 그렇게 ‘가족의 온기를 확인하는 달’이었다
카톨릭의 전통에서 11월은 ‘위령성월(慰靈聖月)’로 지킨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달. 시간이 흐르며 소천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 질수록, 그 그리움 또한 감사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미국의 11월은 ‘감사의 달’ 이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 있고, 곧 대강절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 악조건 속에서도 첫 수확을 거둔 청교도들이 이웃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그 유래다.
그들의 감사는 단순히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역경 속에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미래의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와 믿음을 다짐하는 정신이었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도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보여 주었다.
성경에는 자주 대조의 언어가 등장한다. 빛과 어둠, 선(善)과 악(惡), 진실과 거짓, 공의와 불의,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겸손과 교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
2007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미터 결승에서 두 선수가 똑같이 11.01초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육안으로는 1, 2등 식별이 불가능해 비디오 판독까지 갔다. 판독 결과는 단 0.003초 차이였다. 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더 짧은 찰나의 차이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갈랐다. 인생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른다. 입시, 취업, 사업의 성패까지, 눈 깜짝할 작은 차이로 웃기도, 울기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나 그것을 행운이나 불운으로만 취급하지 말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결과보다 ‘과정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이 넘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기적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맘껏 숨 쉴수 있는 공기, 창문으로 스며드는 밝은 햇살, 수도 꼭지를 틀면 나오는 맑은 물, 풍요로운 식탁 앞에 둘러앉은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이며 축복이다. 감사는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이어령 선생의 '차 한잔의 사색' 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 저 추석 보름달만은 그대 머리 위에서도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가을 하늘의 달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11월을 맞아 모든 잎이 떨어져 사라지는 계절일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이유는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그 감사 하나면, 찬바람 부는 겨울 문턱도 따뜻하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