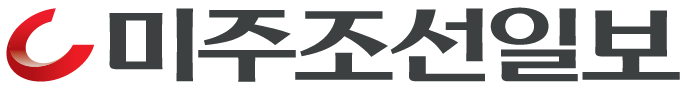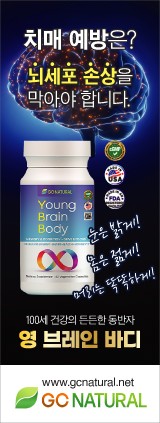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이우근 칼럼] 섬뜩한 유령의 시절
이 우 근
변호사/ 숙명여대 석좌교수
PEN.KOREA 인권위원장
내가 다닌 고등학교의 교훈(校訓)이 ‘자유인·문화인·평화인’이었다. 지금도 그대로일 게다. 교실 정면에 걸린 교훈을 무심히 바라보며 3년을 지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훈에 담긴 뜻이 속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개인의 자유 없이는 창조적 문화정신이 숨 쉴 수 없고, 문화의 인문정신 없이는 사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문화요 인문이다. 인문은 자유의 날숨과 문화의 들숨을 드내쉬며 평화의 꿈을 키워낸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는 옴딱지처럼 단단히 달라붙은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산업화는 세계무역 규모 10위권에 진입하면서 국민소득이 일본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독재와 정치적 독선에 저항하는 시민·학생들의 끈질긴 투쟁이 대통령직선제·단임제를 쟁취하고 여야의 정권교체를 실현해낸 민주화의 물길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처럼 극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다다르는 성과를 이룬 나라는 달리 없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선진문화의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진정한 선진문화는 인문정신에서 싹튼다. 균형 있는 역사의식,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문화적 갈증, 공동체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관용과 상생의 열린 정신… 그 은은한 인문의 향기가 국민과 나라의 품격을 드높인다.
인문학을 문사철(문학·역사·철학)로 분류하는 방식에 나는 반대한다. 인문은 ‘인간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온 말이다. 한마디로 ‘사람됨’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논리체계가 아니다. 논리를 뛰어넘어 직관(直觀)으로 나아간다. 가장 뛰어난 직관의 세계인 종교와 예술이 ‘사람됨’의 자리에 빠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인류역사는 정신적·신체적·정치적 속박의 비좁은 골짜기를 헤쳐 나온 자유혼(自由魂)이 낯설고 이채로운 문화의 징검다리를 거쳐 마침내 평화의 푸른 들판으로 나아온 피와 눈물의 여정(旅程)이었다. 그 여정은 독선과 억압의 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인·문화인·평화인의 고단한,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발걸음이었다. 자유의 대기를 호흡하지 못하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반(反)평화·반문화·반인간의 야만으로 떨어진다. 자유의 뜨락에 문화의 길이 열리고, 문화의 길녘에 평화의 지평이 펼쳐진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정치와 역사, 전쟁과 혁명, 종교와 문화 등 온갖 인간 활동을 겪어온 유럽인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고요한 바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꿈꿔왔다. 유럽인들에게 지중해는 어머니 몸의 아기집처럼 평화로운 영혼의 고향이었다. 그 지중해를 조각가 아리스티드 마욜은 아무 꾸밈없는 나체의 여인으로, 자유와 평화의 염원을 품은 여성성(女性性)으로 형상화했다.
그렇지만 자유는 두려운 가치다. 자유 앞에는 스스로 그리고 홀로 책임져야 하는 적막한 광야가 펼쳐진다.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조지 버나드 쇼의 뼈아픈 지적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자유를 어둑한 눈길로 바라본 사르트르의 탄식이다. 여기의 선고는 저주나 다름없다.
그 자유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책임의 굴레가 무척 두려운 나머지, 다시금 전체주의적 억압의 굴레 속으로 도피하려는 퇴보적 상황에 빠져든다. 에리히 프롬이 갈파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자유의 책임이 포기된 자리에서 문화의 열정은 시들고 평화의 꿈도 사위어간다. 개인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의 영역이 끝 모르게 확장되어가는 오늘, 우리는 거꾸로 정치의 포퓰리즘, 사상의 근본주의, 문화의 획일화가 넘실대는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유를 짓누르고 개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다시금 어른거린다.
자유인·문화인·평화인… 고교시절의 교훈이 절절히 되새겨지는 오늘, 자유의 현실과 문화의 미래와 평화의 전망이 모두 어두운 그늘 아래 웅크려있다. 섬뜩한 유령의 시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