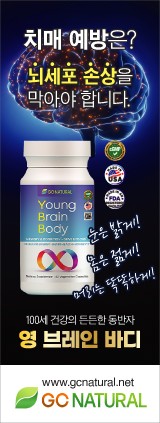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그리스도인이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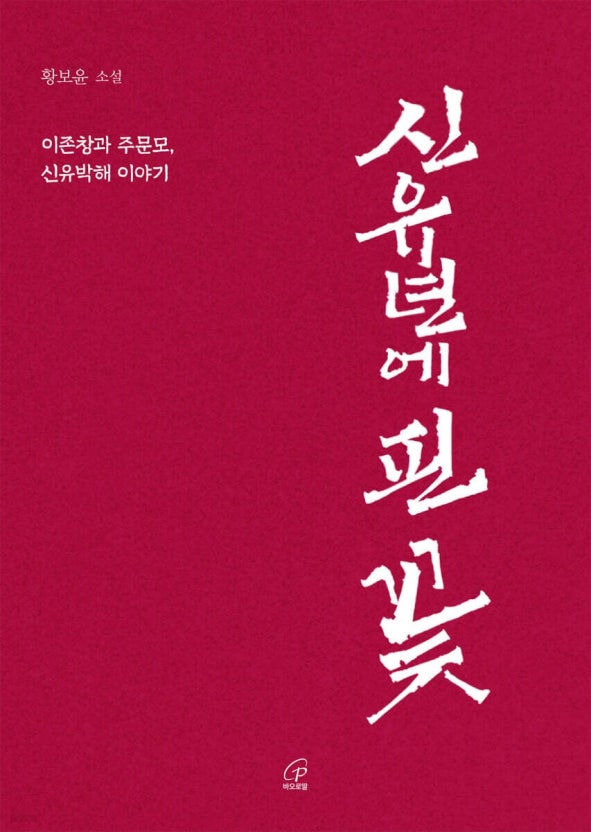
조선 천주교 여명기 조명 ‘신유년에 핀 꽃’
1791년 신해박해에서 1801년 신유박해까지, 조선 천주교의 여명기는 짧았지만 치열했다. 황보윤 작가의 장편소설 ‘신유년에 핀 꽃’(바오로딸 刊)은 이 10년의 격랑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신앙을 붙든 인물들의 내면을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소설은 세 차례 배교 끝에 다시 신앙을 선택한 ‘내포의 사도’ 이존창을 중심으로, 주문모 신부와 신앙 선조들의 고난과 회개, 그리고 순교의 길을 그린다. 건조한 역사 기록을 문학적 서사로 되살려낸 이 작품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신앙의 뿌리를 오늘의 독자 앞에 생생히 불러온다.
1790년, 북경에서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한 주교의 밀지가 전해지면서 신앙과 유교 예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1년 뒤 진산 사건으로 윤지충과 권상연이 처형되고, 이어 한양과 내포, 전주 등지에서 신자들이 대거 검거된다. 이존창은 박해와 고문, 두려움 속에서 세 번이나 신앙을 버리지만, 끝내 신앙을 회복한다. 작가는 그의 내적 갈등과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약종, 강완숙, 황사영 등 실존 인물들과 허구의 김원삼이 어우러져 극적 긴장을 더한다. 특히 이존창과 대립하는 김원삼은 서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회개와 배신, 용서와 갈등이 교차하는 장면들을 이끌어낸다. 또한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우여곡절과 박해 속 사목 활동을 편지 형식으로 전해, 현장감을 배가한다.
“그리스도인이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297쪽)라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문장은 소설에서 가장 울림을 주는 대목이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뿌리가 되었듯, 고난을 넘어 부활을 갈망한 신앙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독자들에게도 깊은 도전을 준다. 이를 반영하듯 소설은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을 향해 선교의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조선 천주교의 짧은 봄날을 비추지만, 길을 찾아 헤매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