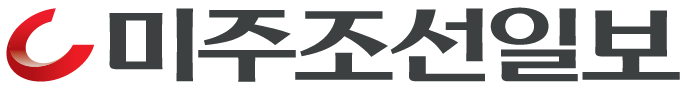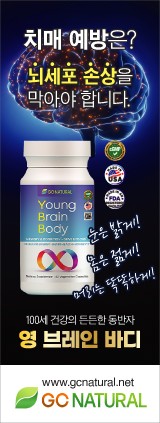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이우근 칼럼] 군중은 진실이 아니라 환상을 원한다
이 우 근
변호사 / 숙명여대 석좌교수
PEN.KOREA 인권위원장
세계 최초의 다국적기업인 동인도회사를 세운 17세기의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인 선진국이었다.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라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희귀한 색깔의 튤립 꽃을 부자들에게 팔면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는 소문이 떠돌자 가난한 사람은 물론 유명인들까지 전 재산을 털어 튤립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석 달 만에 투기 광풍이 시들어버리자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사건이다. 영국 언론인 찰스 맥케이는 <대중의 미망과 광기>라는 책에서 이 소동을 자본주의 최초의 거품경제 현상으로 꼽았다. 비이성적 집단사고에 빠진 군중심리가 광기로 치달아 파멸에 이른 역사적 사례다.
오늘날에는 정보를 대량으로 쏟아내는 인터넷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에 유용한 기술로 쓰이지만, 그와 동시에 거짓 정보를 빠르게 확대 재생산해 비이성적인 군중심리를 광기로 몰아가기도 한다. 미셸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와 광기의 역사>에 이렇게 썼다. “무엇도 광기를 진실이나 이성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광기는 오직 파멸로, 나아가 죽음에로만 나아간다.”
옛 로마에는 전쟁이나 내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로원이 집정관·호민관 또는 시민들에게 법치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었다. ‘긴급사태에는 법률이 없다’는 유스티티움 제도다. 이러한 입법·사법·행정의 일시적 폐기를 조르죠 아감벤은 ‘예외상태’라고 불렀다. 국가비상사태에서 법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고 초법적 권력이 등장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외상태는 법치도 아니고, 법치의 부정도 아니다. 법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이 무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된다.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상태가 교묘히 은폐되기 때문이다. 여기의 권력은 행정권력만이 아니고 입법권력·사법권력도 포함된다. 독일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로 입법권력을 거머쥔 총통 히틀러는 <수권법>으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까지 한 손에 틀어쥔 절대권력자가 되었다.
대법원이 원내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그 정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대법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법 왜곡 판사 처벌법,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가 면소판결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당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재판은 중단해야 하지만 무죄판결 등을 내릴 재판은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기이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다.
명백히 삼권분립원칙의 예외상태를 만들려는 사법부 압박이지만, 법 원칙을 들어 설득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그 정당, 그 후보의 건강한 정치적 미래를 위해 간곡히 권고해야겠다. ‘삼권분립의 예외상태’로 가려는 시도를 속히 거둬들이기 바란다. 그 후보가 말했다.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의사당은 어떤가? 행정부·사법부의 독단은 비민주적이고, 입법부의 독선은 민주적인가?
다수의 군중이 박수 친다고 해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군중은 결코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군중에게 환상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들의 지배자가 되고, 그 환상을 파괴하는 사람은 그들의 희생물로 전락한다.” 귀스타브 르 봉이 <군중심리학>에 쓴 글이다. 민주주의의 험난한 위기를 숱하게 겪으면서 끝내 극복해낸 우리 국민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다.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뚜렷이 분별할 줄 아는 주권자다. 집단 속의 군중은 환상을 바랄지라도, 투표소의 주권자는 민주주의의 진실을 간절히 염원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삼권분립의 예외상태'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명은 진화하지만, 군중은 진화하지 않는다. 인류역사의 진리다.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 진리를 꿰뚫어 보았다. “개인은 현명하다. 그러나 군중은 머리 없는 괴수, 거대하고 야수 같은 바보가 되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