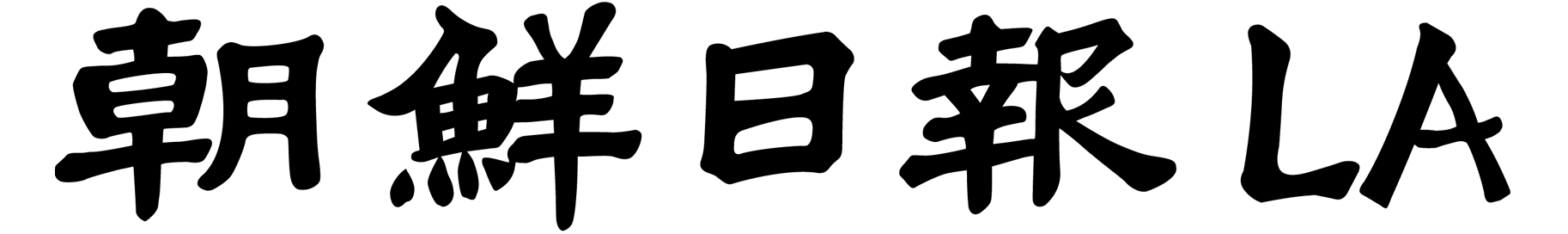[이만훈의 속닥속닥] 냉면
참, 더워도 너무 덥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있어도 정수리부터 등골을 타고 흐르는 땀이 소리만 안 난다 뿐이지 아예 도랑을 짊어진 기분이다. 솔바람 보내주던 숲마저 축 늘어진 채 가쁘게 할딱이니 옛 사람들이 “염소 뿔도 녹인다”고 한 말이 과시 뻥튀기만은 아닐 듯싶다. 당대의 시인 유종원(柳宗元)은 폭염의 더위에 지치는 게 마치 술에 취하는 것 같다(溽暑醉如酒)고 했다. 중서(中暑)는 더위를 먹는다는 뜻인데 더위도 더위 나름이지 요즘 더위는 술로 치면 족히 50도는 될 테다. 한껏 취해 온 몸이 나른한 게 매가리가 하나도 없다. 작달비라도 한 판 세게 뿌렸으면 좋으련만…. 애꿎은 샤워기만 입술이 부르틀 지경인데 아무리 물세례를 받아도 잠시뿐 아예 몸이 익는 것 같다. 바깥 열기가 뱃속까지 침노해 불덩이가 이글대는 탓이다. 불을 끄려니 나도 모르게 찬물만 들이킨다. 그래도 갈증이 가시지 않아 이내 짜증이 된다. 입맛은 애저녁에 천길만길 뚝 떨어졌지만 그나마 꾸물거리려면 뭐라도 먹어야 한다. 뭘? 맞다, 냉면이다!
# 냉면집에 가려면 더위의 포위망을 뚫고 가야 하는 패러독스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어이하랴, 뼛속까지 스며든 더위를 쫓아내려면 뼛속까지 냉기를 침투시켜야 하는 데 냉면만한 게 없으니-. 시절이 좋아 에어컨이 빵빵하게 터지는 면옥(麵屋)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앉아 손바닥이 쩍 달라붙는 놋그릇에 살얼음이 동동 뜬 육수 한 가운데 똬리를 틀고 앉은 면발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이다. 방금까지도 정신마저 혼미할 정도로 온 몸을 고문하던 더위란 놈은 저만치 삼십육계 줄행랑이요, 머릿속조차 투명한 얼음처럼 산뜻 명징해지고야 만다. 우선 국물부터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식초며 겨자는 치거나 말거나 조자룡 장창 쓰듯 젓가락을 조화부리며 사리를 말아 올리듯 건져 입 안 가득 빨아대면, 채 씹기도 전에 목구멍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시원스레 간질간질 넘어가는 그 맛이라니…. 냉면은 축복이다!
# 냉면은 본래 겨울음식이었다. 메밀은 수확이 늦가을에 이뤄져 겨울이 제철인 셈인데다 육수로 김장으로 담근 동치미나 백김치의 국물을 썼으니 이래저래 겨울이 돼야 먹을 수 있었다. 여기에다 평양 등 북쪽지방은 겨울철 추위가 매서운 까닭에 불을 많이 때다 보니 초저녁 참에는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여서 이를 식히기 위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을 테니 “에라, 국수나 말아라!”가 절로 나왔으리라.
동짓달이 되면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 사람들이 ‘물냉’과 ‘비냉’을 시절 음식으로 즐겨 먹었다. 유득공(柳得恭)이 평양의 풍속을 노래한 『서경잡절(西京雜絶)』에서 ‘냉면 때문에 돼지 수육 값이 막 올랐다네(冷麪蒸豚價始騰)’라 한 걸 보면 18세기에 서도(西道)에서 냉면이 대단히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趙斗淳·1796~1870)이 서울 마포(麻浦)에서 지은 시는 19세기 무렵에는 이미 서도의 냉면이 한양에까지 진출했음을 간증하고 있다.
‘풍악소리 서쪽 누각에 요란한데(笙簫迭發鬧西樓)/소나기에 저녁바람 불자 가을처럼 시원하네(驟雨斜風颯似秋)/옆집 고운 여인 새로 배운 솜씨를 발휘하니(賴有芳隣新手法)/평양냉면이 사람의 목구멍을 시원하게 하네(箕城冷麵沃人喉)’
# 평양냉면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경성의 요정에 진출하면서 한반도의 남부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더욱이 당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메밀순면 ‘소바(そば)’ 문화가 결합되면서 평양냉면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
겨울철 별식이었던 냉면이 요즘처럼 여름음식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부터. 한여름에도 얼음의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근대적인 제빙(製氷)기술과 겨울에 캐낸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 한국에 제빙소가 처음 등장한 건 1909년 부산항 근처에 공장을 세운 대한제국 탁지부(度支部)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기가 충분치 않았던 탓에 재래식 채빙과 장빙(藏氷)이 더 선호됐다. 따라서 실제로 제빙공장에서도 얼음을 직접 만들어내기보다는 겨울에 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얼음장사가 워낙 짭짤했던 까닭에 소위 ‘제빙회사’란 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910년대 중반 이후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경성거리에 ‘빙수점(氷水店)’이란 간판을 내건 가게나 포장마차들이 등장하곤 했다. 한여름에도 얼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경성과 평양에서는 바야흐로 여름냉면이 등장하게 되고, 삽시간에 대단한 인기메뉴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냉면을 위해서는 얼음에다 육수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때 냉면업계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화학조미료인 ‘아지노모도(味の素)’였다. ‘아지노모도’는 1915년경부터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해 1920년대 말에는 이미 이 땅의 전역에서 대박을 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김칫국 대신 냉면육수용으로 팔리면서 ‘계절불문’ 냉면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오늘날 우리가 한여름은 물론 사시장철 냉면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한강·대동강의 얼음과 ‘아지노모도’ 덕분인 셈이다. 근래 몇 년 전부터 냉면 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식 물가를 선도한다고 해서 ‘누들플레이션(noodleflation)’이란 신조어까지 유행하는 판이다. 웬만하면 한 그릇에 1만 원이 넘고 제법 이름 좀 있다 하는 집에선 2만 원 짜리도 있다 하니 이미 서민 음식은 아닌 셈이다. 아, 냉면이여!

이만훈 칼럼니스트: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한국 중앙일보에서 경찰, 국방부 출입 등 사회부기자를 거쳐 문화재 및 인터뷰 전문기자를 지냈다. 향수를 자극하는 사투리나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탁월하고 유려한 문장을 더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 소개 등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