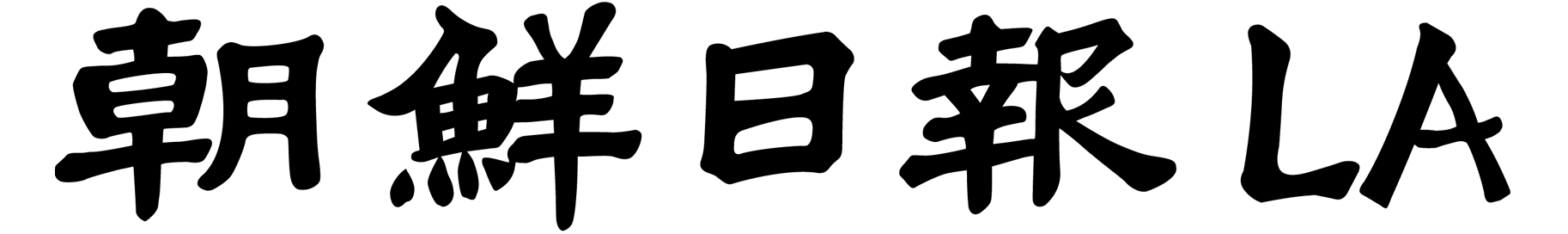[살며 생각하며] 위로
김희식
(주)건축사무소 광장 상무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추수를 앞둔 마을 논의 벼들도 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나뭇잎도 가을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CNN 방송 인터뷰 관련 보도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간 들어준 사람의 숫자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1040개 병상 규모의 템파종합병원에서 8년 동안 환자와 가족들을 상담해 온 한국계 목사 준 박(Joon Park)의 얘깁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성직자와 치료사의 중간성격인 ‘치료목사(Therapriest; Priest+Therapiest)’ 라고 소개했습니다. 환자에게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라는 소신으로 들립니다.
많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온 박 목사는 대부분의 임종을 앞 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삶을 후회한다. 둘째, 죽지않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셋째,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걱정을 한다. 넷째는 환자들 대부분이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했을 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의 후회나 걱정이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가진 자원·시스템·환경·주변문화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이민자 2세로 플로리다 키웨스트 라르고에서 출생한 40대 초반의 박 목사. 자신도 성장하면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자랐답니다. 성장과정이 트라우마로 남게 된거죠. 그는 성인이 된 뒤 이를 극복하는데 ‘영성’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나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이러한 생각이 그를 병원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주변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피스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케슬러의 공동저서 '인생수업'이 생각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교사들입니다. 삶이 더욱 분명한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 몰린 바로 그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지요. 이 세상이 하나의 학교라면, 상실과 이별은 그 학교의 주요 과목입니다.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보살펴 주는 사랑하는 이들,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자각하기도 합니다. 상실과 이별은 우리의 가슴에 난 구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 내고,그들이 주는 사랑을 담아 둘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하긴 우리가 살면서 상실과 이별만 있는 것일까요? 성취도 있습니다. 살고 있다는 것, 살아내고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한 성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수업'의 번역을 맡았던 ‘류시화’의 표지 머릿글을 이어 봅니다.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많은 시작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 만큼의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삶에서 그 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이다/ 별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를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별과 상실도 성취의 한 부분이며, 이를 수 없더라도 별 하나 쯤은 지니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을 탓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