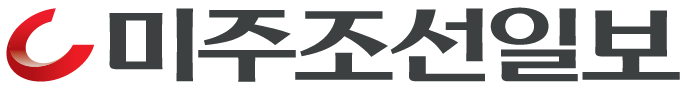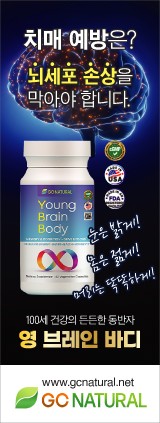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이우근 칼럼] 유령의 그림자
이 우 근
변호사 / 숙명여대 석좌교수
PEN.KOREA 인권위원장
이성과 과학의 시대라던 20세기는 놀랍게도 전체주의의 유령이 세계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시기였다. 청일‧노일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한 일본은 군국주의로 치달리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으로 등장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전체주의의 씨앗을 듬뿍 뿌린 탓일까, 북한에서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줄곧 전체주의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80년 동안 일가족이 3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는 곳은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교활한 선동술로 독일국민의 분노와 공포를 결집했고, 나치즘의 광기에 흠뻑 젖은 대중과 관료들은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그 관료들 가운데 의회 의원들, 사법부의 법관들이 있었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법관으로 임명되었고, 히틀러는 사법부를 장악했다. 삼권분립은 붕괴되었다.
나치당에 점령된 의회는 수권법으로 히틀러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법관들은 히틀러에게 법적 정당성을 덮어씌웠다. 총통 히틀러는 법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만약 그대들이 총통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재판하라.”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총통의 뜻이었다. 수많은 법관‧검사‧변호사‧법학교수들이 사실상 히틀러의 공범이자 가해자였고, 법치의 껍데기를 둘러쓴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법실증주의자 한스 켈젠은 ‘법은 도덕과 분리된 명령체계’라고 주장했다. 의회가 제정한 실정법은 비록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더라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 악법을 위헌이라고 무효 선언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이자 권능이건만, 사법부가 이른바 선출권력인 총통이나 입법부보다 서열상 하위에 있었던 나치 시대에 그런 사법의 권능을 인정될 리 없었다.
스탈린은 마르크시즘을 1인 독재의 전체주의 체제로 이끌었다. 그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비밀경찰의 손에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러가기 일쑤였다. 스탈린 시대에 파스테르나크가 쓴 소설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 이름은 그 어근(語根)이 러시아어로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소설의 무대가 된 러시아 혁명 시절의 전체주의 체제가 스탈린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 아닐까.
그렇지만 스탈린 시대만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입법‧사법‧행정을 모조리 장악하려는 전체주의 유령의 그림자가 다시 어둡게 드리우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은 모든 헌법기관 위에 버티고 앉아 삼권분립원칙을 짓밟았다. 중국은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판사의 임면권을 행사한다. 법관 인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그 어두웠던 옛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이 정치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정과 대법관실을 돌며 어느 파기환송 판결의 정당성을 검증하겠으니 관련 전산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어떤 의원은 대법원장을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합성사진 팻말을 번쩍 들기도 했다. 야당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사실상의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재판관련 자료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몰라도,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면 대법원장은 물론 일반 법관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형식적 합법성’이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다. 입법자가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을 저버리거나 법률가가 양심을 내팽개치면, 법은 폭력의 무기가 될 뿐이다. 실정법은 헌법의 이념, 이성과 양심의 빛 아래에서만 정당성을 지닌다. 그것이 삼권분립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헌법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