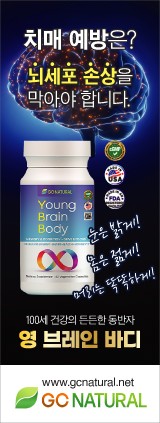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이만훈의 속닥속닥] 알밤의 추억
가을 빛깔은 강렬하다. 봄부터 겪어온 모든 영화와 풍상을 빛깔로 토해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빛의 아름다움은, 꽃보다 더한 아름다움은, 쪽빛 하늘에 비치어 불꽃처럼 타올라 온누리를 물들이곤 어느 날 문득 짙은 갈색으로 전설이 된다. 외려 장렬하다.
나는 가을 빛깔 중에서도 가운데쯤 되는 밤색을 좋아한다. 거무스름한 주황빛이 나는 색깔, 즉 일반적인 갈색보다 어두운 붉은 색을 띤, 그야말로 잘 익은 알밤 껍질의 색깔 말이다. 그건 나에게 고향의 내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마법이기도 하고, 시간을 거슬러 동심으로 되돌려 주는 초능력이기도 하다. 나한테 알밤은 ‘고향’이란 말의 동의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는 산뿐만 아니라 행길 옆, 개울가는 물론 봇도랑 둑과 심지어 우물가에도 밤나무가 도열하고 있을 정도로 ‘밤나무골’이었다. 그러니 학교를 오가다, 또는 놀다가 출출해질라치면 아무 데나 밤나무 밑으로 가 어슬렁거리게 마련이었고, 금세 다람쥐 볼때기마냥 주머니마다 터질듯 배불뚝이가 돼 나오곤 하는 게 가을날 흔한 풍경이었다. 꼬맹이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죄다 알밤 까먹기 선수여서 마치 청설모처럼 앞니로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벗기고는 이어 “퉤”소리 몇 번이면 턻은 보늬까지 말끔히 없애고 우그적 우그적 맛있게도 먹었다. 학교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화단과 교실바닥에도 밤 껍질 투성이여서 HR(자치회의)시간이면 “밤 껍질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결의가 단골로 등장하곤 했었다.
#얼마 전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에 커다란 밤나무 밑을 지나며 아람을 토해내고 떨어진 개박송이가 즐비한 것을 보았다. 성묘를 마치고 집에 들르니 셋째 형님께서 주운 것이라며 한 되는 좋이 될 밤을 주머니에 담아주셨다. 모처럼 가을맞이 호사를 하는 것 같아 찡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은 밤 부자(富者)였다. 해마다 가을이면 알밤으로만 가마니로 그득그득 수십 가마씩 거둬들였다. 요즘은 밤 하면 충남 공주를 치지만 당시엔 우리 계가 으뜸으로 꼽혔다. ‘국민(초등)학교’ 사회책에도 밤 주산지로 양주(楊州)고을이 실렸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알이 굵으면서도 맛이 좋기로는 광릉산 자락인 우리 동네가 최고였다. 우정 심은 것도 아니건만 백 살도 좋이 넘었을 법한 아름드리 밤나무들이 울울창창(鬱鬱蒼蒼) 온 산을 덮고 있었다. 밤꽃 내음이 유난한 해엔 그루마다 알밤으로 두어 가마씩 거두는 게 일도 아닐 정도로 큰 나무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을이면 벼 수확 다음으로 밤을 따 들이는 게 큰일이었다.
#우리 동네에선 밤 철이면 뽑혀 다니는 고수가 고작 서넛뿐이었다. 거기에다 집집마다 벼는 물론 다른 곡식이며 고추 등의 가을걷이가 줄줄이 늘어선 판이라 선수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 밤을 다 거둬들이려면 적어도 한꺼번에 여남은 필요한데 늘 턱도 없어 엄니는 늘 끌탕을 하셨다. 밤의 풍흉에 달리기도 하지만 일꾼 모으기 사정에 따라 밤 따기에만 며칠씩 걸리기도 했다. 밤 더미에는 풀을 베어다 고루 두툼하게 덮어주고 그 위에 물을 뿌려주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덮어준 풀이 썩으면서 밤송이도 함께 물크러져 조금만 힘을 가해도 밤톨이 쉽게 삐져나오게끔 하는 지혜다.
#밤나무에서 밤송이를 털어오는 게 밤농사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밤송이에서 밤톨을 끄집어내는 밤 까기 작업이다. 밤 까기는 다른 가을걷이를 모두 마친 뒤 이른바 한겨울 농한기에 주로 한다. 풀이 썩는 기운에 덩달아 반쯤 썩은 밤송이를 발로 뭉개거나 호미나 낫으로 툭 쳐서 밤알을 빼내 둥구미나 함지박, 다라, 도레방석 등에 담는 단순작업이라 조무래기들이 거들기도 하지만 예전 겨울은 워낙 추웠던 탓에 밤 까기는 거의 안식구들 몫이었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작업을 한다고는 해도 어차피 한데라 엄동 추위를 견디며 일하기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작업 끝에 얻은 알밤은 가장 굵은 왕밤, 가운데 굵기의 중치, 그리고 잔챙이와 벌레먹이 파치로 구분해 가마니에 옮겨 담아 보관했다. 밤 가마니는 헛간을 채우고도 남아 봉당의 여분댕이는 물론 처마 밑을 빙 둘러가며 공간이란 공간은 죄다 차지했다. 할머니께선 상품성이 없는 잔챙이와 파치 밤을 커다란 가마솥에 삶게 해 이웃들에게 몇 바가지씩 퍼주시곤 했다.
#벌써 곳곳에 군밤장수가 등장했다. 조금 더 스산해지면 어느 곳이랄 것도 없이 온 나라가 구수한 군밤향기로 젖어들 테다. 밤 가운데에서도 가장 맛이 좋기로는 역시 군밤이다. 날밤이나 삶은 밤, 그리고 밤을 두어 만든 밤밥, 밤송편, 밤설기, 밤범벅, 율단자(栗團子·밤고물을 묻힌 찹쌀떡)도 맛이 그만이지만 군밤에는 양보할 듯싶다. 군밤은 무기교의 요리(?)다. 그래서 더 끌리고 맛있다. 하지만 아궁이냐, 화로냐, 가마솥이냐에 따라 혹은 장작불과 잿불, 연탄불에 따라 제 각각 맛이 다르다. 여기에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구운 걸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 군밤의 맛은 팔 할이 분위기다. 나머지는 불 맛이다. 불 맛은 불의 세기와 맞추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모자라면 서걱서걱 날밤만도 못하고, 넘치면 까실까실 입안이 매캐하다. 그래도 단군 이래 이제껏 군밤을 마다하는 이는 없다. 가위 민족의 주전부리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 어둑한 골목길 어귀에서 희미한 가로등을 머리에 인 채 리어카 탄불에 군밤을 뒤적이는 이와 그로부터 막 받아든 봉지에 반쯤 얼어 곱은 손가락을 넣고 뜨겁기조차 한 군밤을 끄집어내는 이, 그리고 오백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입을 벌리기 무섭게 ‘낼름’ 받아먹는 이-. 때마침 떨어지는 눈발도 그 좋은 군밤내음에 취해 비틀비틀 어지럽고, 소리 없이 마주하는 웃음들이 내내 포근하다. 아, 달고나보다 더 오래고, 달고나보다 더 달콤했던 군밤의 추억이여! 군밤은 맛 홀리기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다.

이만훈 칼럼니스트: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한국 중앙일보에서 경찰, 국방부 출입 등 사회부기자를 거쳐 문화재 및 인터뷰 전문기자를 지냈다. 향수를 자극하는 사투리나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탁월하고 유려한 문장을 더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 소개 등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