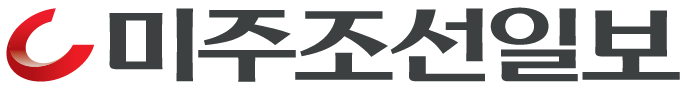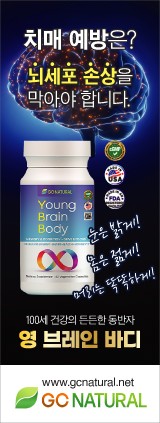[JAZZ와 인생] 실용음악, 삶을 위한 음악의 시작
김영균(팝 피아니스트)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실용음악과는 대학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왔다.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는 ‘실용음악(Gebrauchsmusik)’ 혹은 ‘생활음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근대 작곡가였던 그는 감정과 주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마치 그것을 신봉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술가이고 나머지는 열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표현주의 음악에 대해,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실용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던 원조 격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연주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곡이 쉬워야 하고, 연주하는 사람 또한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곡의 길이는 적당해야 했고, 형식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실용음악의 핵심이다.
실용음악은 클래식 음악에 비해 다소 단조롭고, 강렬한 감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용음악인 재즈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깊이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진짜 음악’이라고 확신하며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평생 한길 만을 고수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화음들이 겹겹이 쌓여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때, 이를 폴리포닉스(polyphonics)라 부른다. 얼핏 들으면 불협화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배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깊고 오묘한 하모니는 재즈만이 지닌 독특한 음악적 세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복잡한 리듬까지 더해지면서 재즈는 더욱 특별한 음악으로 다가온다. 마치 검은색과 하얀색이 만나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색채가 탄생하듯, 전혀 다른 화음들이 만나 폴리포닉스를 이루는 것처럼, 흑과 백으로 상징되는 뿌리 깊은 차별 또한 재즈 음악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 수원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