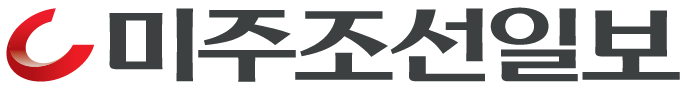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크리스천칼럼] 단풍잎이 비록 낙엽일지라도

창문 밖이 허옇게 열리는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뒤뜰로 나섰다. 나팔꽃은 어느새 활짝 웃고 있는데, 담벼락엔 찬기가 스친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때론 필라델피아 10월의 길목에서 어깨를 움추리게 하던 바람결을 느낀다. 어쩌면 내가 살았던 필라델피아 외곽에는 곱게 물든 단풍나무들과, 집집마다 벽난로에 장작타는 냄새로 가을의 향취를 이미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라델피아에 인접한 남부 뉴저지에서 맞이한 미국의 첫 가을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때 나는 갓 결혼하고 이민의 삶을 시작하는 새내기였다. 남편이 영어공부를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내주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멀리 큰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 옷을 입고 병풍처럼 늘어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 풍경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한국 고향에서 보고 자란 그 가을 풍경이었다. 가까이 가서 가을 풍경을 보고 싶었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난 오솔길을 발견했다. 비포장 도로였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그 길을 따라 갔더니 어느 집 앞마당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놀래서 급히 차를 돌려 나오는데 경찰차 한 대가 반대편에서 나를 지나쳐 갔다. 혹시 집 주인이 이상히 여겨 경찰을 불렀나 싶어 다급해진 마음으로 차를 달려 그 길을 빠져나왔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낮의 일을 말해 주었다. 남편은 걱정스런 얼굴로 위험하니 앞으로는 절대 아무 곳이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 단풍을 쫓아갔던 그 오솔길이 아마도 그 집의 드라이브웨이였을 거라고. 개인소유의 땅이요 사생활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었다. 한 앤 어브 그린 게이블스(Anne of Green Gables by L.M. Montgomery)의 빨강머리 앤처럼 호기심 많은 나의 상상력이 빚은 해프닝이었다.
다음날 정오쯤 남편이 그로서리 브라운백 하나 가득 단풍잎을 담아왔다. 형형색색 예쁘게 물든 단풍잎들이 수북이 들어 있었다. 시들기 전에 보여주려고 점심시간에 잠깐 들렸노라고….
남가주로 이주한 후로는 단풍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두 번 쏠뱅 가는 길에 아찔하게 구불거리는 산자락을 오르면서, 잠깐씩 스치던 풍경 말고는 기억이 없다. 30여 년 전 남편이 종이팩 한 가득 가져다 주었던 그런 단풍잎들은 주변에서 보기 어렵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가끔 동네를 산책하다가 길에 떨어진 낙엽 몇 개 주워서 돌아올 때면 왠지 즐겁다.
매년 입버릇처럼 말하던 필라델피아의 가을이 또 그리운 계절이다. 철부지 앤이 되어 무작정 쫓아갔던 그날의 단풍이 다시 보고 싶다. 아무래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가까운 산에라도 다녀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