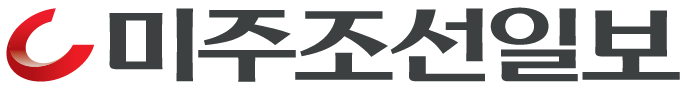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의료 칼럼] 당근으로 배우는 당뇨관리
임영빈
K-day PACE 원장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2 마지막 관문인 ‘무한 요리 지옥’에서 당근은 주인공이었다. 제한된 재료로 끝없이 변주되는 당근 요리를 보다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시식을 다 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놀라운 건 셰프들의 공통된 표현이다. “당근의 단맛을 잡아야 한다.” “당근의 단맛이 너무 많다.” 특히 당근을 짜장면으로 풀어낸 창의적인 시도는, 단맛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기술이 요리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당뇨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뇨환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당근은 달잖아요. 당뇨에 안 좋죠?” 많은 사람들은 당근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당장 달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요리하면 달아지는 걸 경험하면, 당근을 곧장 ‘피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해 버린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놓치는 핵심은 따로 있다. 당근의 당분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그 당분이 몸에 ‘어떤 속도로,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가 진짜 변수라는 점이다.
당근 속 당분은 처음부터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식물의 단단한 구조 안에 갇혀 있다가, 씹는 과정에서 천천히 풀려난다. 처음엔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 계속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이유다. 다시 말해, 같은 당근이라도 “씹어 먹는 당근”은 당이 천천히 드러나고, 일부는 섬유질과 함께 남아 있는 상태로 장까지 내려간다.
반면 채를 아주 곱게 썰거나, 갈거나, 즙으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당분은 이미 ‘노출된 형태’가 되어 빠르게 흡수된다. 한때 건강음료로 유행했던 사과·비트·당근 주스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료가 건강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구조가 남아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관점은 당뇨관리의 시야를 넓힌다. 우리는 흔히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같은 용어로만 음식을 분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실용적이다. “이 음식은 곱게 갈렸는가, 입자가 작아졌는가, 씹을 시간이 사라졌는가.” 밀가루 음식은 밀을 갈아 입자를 작게 만든 결과다. 즉, 당분이 이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쉽다. 당근도 마찬가지다. 같은 식재료라도 ‘씹는 음식’인지 ‘마시는 음식’인지에 따라 혈당반응은 달라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근은 단지 당만 가진 채소가 아니다. 당근에는 식물성 영양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다. 이런 성분들은 혈당을 즉시 떨어뜨리는 약처럼 작동하진 않지만, 혈관과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당근을 ‘갈아서’ 빠르게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먹을 때, 이 장점을 스스로 희석시킨다는 데 있다. 당뇨는 혈당 수치의 게임이 아니라, 혈당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혈관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관리하는 싸움이다. 따라서 당근을 두려워할 이유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을 이유도 없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결국, 당뇨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금지목록이 아니다. 음식의 ‘형태’를 읽는 능력이다. 당근을 씹어서 먹을 것인가, 갈아서 마실 것인가. 같은 당근이지만, 몸은 전혀 다른 음식으로 취급한다. 당근의 단맛을 걱정하기 전에, 그 단맛이 어떤 경로로 몸에 들어오는지부터 따져보자. 셰프들이 단맛을 ‘없애지 않고 다루듯이’, 우리도 당을 ‘피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근 요리 열풍이 던진 가장 유익한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 모른다. 당뇨는 단맛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맛의 속도를 관리하는 일이다. 문의 (213) 757-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