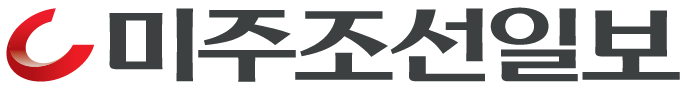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2026년을 열며] 새해는 '한 걸음만' 더

이보영
미주조선일보 독자부 위원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의 밝은 빛이 온누리를 비추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을 머금은 ‘병(丙)’, 힘차게 달리는 ‘말(午)’, “붉은 말띠의 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달려 나가는 붉은 말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역동적으로 기운차게 나가리라는 믿음을 새해를 맞이한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새출발’ 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은근한 기대 때문일까. 혹은 작년에 남겨진 아쉬움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작은 소망때문일까.
출발할 때면 누구나 설레임과 두려움을 느낀다. 가슴 속으로 새로운 결심도 새긴다. 일찍 일어나기, 매일 운동하기, 덜 먹기, 베풀며 살기, 한 템포 느리게, 배려와 양보하기, 등등.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대개 1월 중순 쯤이면 ‘내 안의 또 다른 나’에게 지고 자포자기해 버린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은 누구나 잘 아는 현실적 농담이다.
요즘 나이 든, 시니어들은 새해를 출발할 때 아주 ‘작은 목표’ 를 세우며 가볍게 시작한다. 작은 목표는 가급적 실패할 확률이 적고,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지혜’ 라는 것을 터득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구두 가게에 매년 새해 첫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손님이 있었다. 여든 남짓하게 보이는 그는 해마다 낡고 해진 구두 한켤례를 들고 와서 수선을 맡겼다.
굽은 거의 닳았고 가죽은 터져 갈라져 있었지만, 손님은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올해에도 이 구두를 신고 작년보다 좀 더 멀리 걸어보려고 합니다.”
구두공은 묵묵히 새굽으로 갈아 끼우고, 터진 가죽을 잘 꿰매어 메운 뒤, 마지막으로 구두 전체를 깨끗하게 털고 손질한 후, 구두약을 발라 반짝반짝 광(光)을 내어 손님에게 건넸다.
그리곤 손님에게 덕담을 건넸다. “헌구두가 새구두로 변했습니다. 멀리 가시지는 말고, 올해는 작년보다 그저 ‘한 걸음씩만’ 더 걸으세요. 그 한걸음이 매일 작은 기쁨으로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해마다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가 곧바로 포기하는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가 된다. 작은 변화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한 걸음 정도 쯤이야 자신있다’는 현실적 낙관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한 걸음’ 에 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과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새 내 모습은 나도 모르게 품격과 삶의 향기가 은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새해 첫 신문 (신년호)에는 어떤 특집 기사가 실렸을까?
기대와 궁금증으로 ‘미주조선일보’를 들고 계신 독자 여러분께 조심스레 권하고 싶다.
올해는 큰 목표보다, 그저 ‘한 걸음만 더’ 를 목표로 삼아보시기를. 이 작은 걸음들이 모이고 쌓이면, 전에 못보고 지나쳤던 길이 어느 날 문득 보일지도 모른다.
먼지 묻은 낡은 구두를 털어내고 새 광을 입히듯이, 우리 마음의 묵은 때도 털어내고 새 광을 입혀, 천천히, 조심조심 한 걸음씩만 더 걸어보면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작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새해를 여는 애독자 여러분,
어제보다 잘 하려 애쓰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너는 것이 평범하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루 ‘한 걸음’이 기적의 결실로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