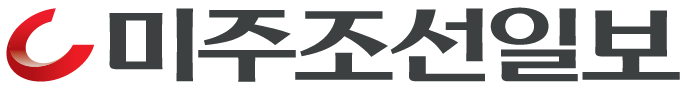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강정실의 세상읽기] 오늘날의 <죄와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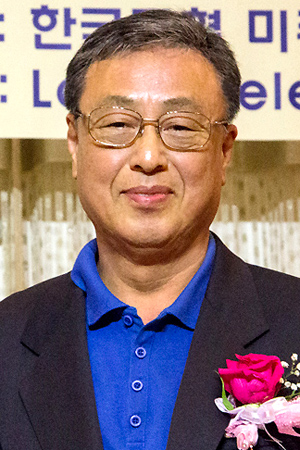
강 정 실 (문학평론가)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대표작 ‘죄와 벌’은 한 청년의 범죄와 구원을 넘어, 자신 양심에 대해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진다. 소설 속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위대한 인간은 도덕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당화하며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한다. 그는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처럼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정한 악(惡)을 저질러도 그 목적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을 시험하는 사회적이면서 도덕적 실험이었다.
이 소설의 진정한 무게는 법적 처벌보다 내면의 형벌에 있다. 그는 범죄 직후부터 악몽과 불면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노련한 수사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와의 심리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이 무너짐을 깨닫고 내면의 형벌을 받는다. 작가가 말한 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양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생겨나는 영혼의 균열이다. 그런데 그를 구원으로 이끈 존재는 법이 아닌 소냐였다. 소냐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매춘부였지만,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껴안아 주는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킨다. 그녀의 헌신은 인간이 다시금 자신을 회복할 길이 오직 ‘공감과 사랑’임을 상징한다.
2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라스콜니코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의 죄는 피로 물들지 않는다. 대신 효율과 성과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주어진 일에 대해 성과를 냈으니 괜찮다’,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일이다’ 등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우리의 도덕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든다. 라스콜니코프가 ‘비범한 인간은 법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듯, 오늘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은 윤리를 넘어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그 믿음의 끝에 남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피로와 공허, 설명할 수 없는 무감각해진 양심적 불안이다. 성과를 위해 타인을 경쟁자로만 바라보는 사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감정과 신뢰를 잃어가는 일상은 어쩌면 ‘양심의 피로’라는 이름의 현대적 죄와 벌이다. 또한, 이 소냐적 인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전쟁과 모순된 사회적·정치적 뉴스에 익숙해졌고, 타인의 절망에 대해 침묵하며 무심해 있다. 무관심은 현대인이 짓는 가장 깊은 죄이며, 그로 인한 고립과 불안이 우리의 벌이 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 성경 구절은 단순한 신앙적 문장이 아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라는 인간회복의 선언이다.
아직도 소설 ‘죄와 벌’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범죄가 살인에 의한 피로 씌워졌다면, 우리의 죄는 무관심과 자기합리화로 빚어지고 있다. 그가 소냐의 사랑을 통해, 시베리아 유형 속에서 구원을 찾았다면, 우리는 관계 회복 속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는 지금, 너의 행동이 평화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