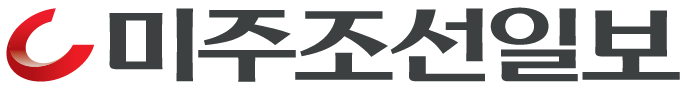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지식과 감성 사이] 소란이 멎고 난 자리, 남겨진 이야기

김미향
오클렘그룹 대표
미국의 셧다운이 끝났다. 정치는 다시 서로의 책임을 따지고, 언론은 어느 진영이 더 득을 보았는지 분석하며 여론을 분주하게 흔든다. 하지만 정치의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이름 없는 이들의 일상이다. 하루 일당이 끊기면 금세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들, 약 한 알이 없어 하루의 평온을 잃는 환자들, 렌트비를 마련하지 못해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는 가정들. 이들에게 셧다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우리는 거대한 갈등의 소용돌이 앞에서 자주 본질을 놓친다. 뉴스가 말하는 ‘국가적 혼란’은 결국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누군가의 텅 빈 냉장고 안에서, 누군가의 손끝에서 가장 먼저 체감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위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얼굴을 향해 먼저 고개를 돌리는 일에 더 가깝다.
예술은 오래 전부터 그런 얼굴들을 대신 바라봐온 존재다. 예술가들은 시대가 흘려보낸 감정들, 이름 없이 사라진 고통들, 조용히 버티던 인간의 모습을 포착해 작품 속에 대입했다. 그래서 한 시대의 흔들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예술의 언어를 빌린다. 그 언어는 삶을 장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가난의 색조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함께 존재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어둑한 등잔불 아래 놓인 그 식탁은 결코 풍요롭지 않다. 그러나 농민들의 굳은 손과 서로에게 기울어진 몸은 묘하게 따뜻하다. 고흐는 세련된 아름다움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난하더라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의 품위라는, 소박하지만 강한 빛을 그렸다.
뭉크의 ‘절규’는 혼란의 시대가 남긴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 붉은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침묵의 비명은 한 개인의 공포이면서도, 시대 전체가 어딘가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의 우리도 정치적 파동 속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예술은 그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더 정확히 바라보게 만든다.
프리다 칼로의 ‘부러진 기둥’은 인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디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서진 몸, 열린 흉부, 그리고 그럼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시선. 프리다는 고통 자체를 회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다시 ‘서는지’를 조용히 보여주었다. 어떤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의 자세를 상기시키는 작품이다.
음악과 무용도 시대를 예민하게 기록한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은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렬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울림 사이에 숨어 있는 인간의 의지는,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피나 바우쉬의 ‘카페 뮐러’에서는 무용수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난다. 그 몸짓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의 발걸음과도 닮아 있다. 벽에 기대고, 서로에게 기대며, 다시 중심을 찾는 모습. 그 부드러운 움직임은 인간이 혼자서는 완전해지기 어렵지만, 서로의 손길을 빌릴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렇게 예술은 혼란의 시대 뒤에서 언제나 조용히 말한다. 당신이 잊은 얼굴을 여기 다시 보여준다고. 당신이 내려놓은 공감을 여기에 다시 기록해 두었다고.
셧다운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치적 결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흔들렸던 얼굴들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괜찮은 척 살아온 일상 속 균열을 살피고, 그 균열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일. 예술은 그 질문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다.
고흐의 식탁, 뭉크의 붉은 하늘, 프리다의 깊은 눈동자, 피나 바우쉬의 흔들리는 걸음. 이 모든 장면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삶은 흔들리지만, 인간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다시 중심을 찾아간다고. 그리고 예술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조용히 불을 밝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