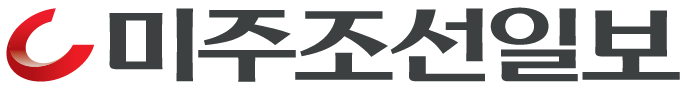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JAZZ와 인생] 절망이라는 죄
김영균
팝 피아니스트
살다 보면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일이 막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는 않는다. 바닷물의 3% 소금이 썩음을 막듯, 우리 마음속 단 3%의 희망이 삶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우화가 있다. 한 악마가 자신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쓰던 도구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기괴하고 흉악한 도구들이 즐비했는데,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한쪽 구석, 작은 쐐기 하나만은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았다. “저건 뭡니까? 왜 가격이 없죠? 저걸 제게 파시오.” 다른 악마가 묻자, 주인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건 절망이라는 도구다. 이건 팔지 않는다. 내가 가장 즐겨 쓰는 거거든. 강하다고 잘난 체하는 자도 결국 이 쐐기 앞에서는 무너진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끝에 삶을 내려놓는 현실을 본다. 이유는 달라도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몇 해 전 신문에는 서울 한강대교 난간에 걸려 있던 작은 노트 이야기가 실렸다. 한강에 몸을 던졌다가 살아난 이가 남긴 글이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고통은, 살아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혹독하다.”
희망은 누군가가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붙잡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려는 의지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한다. “까짓 거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희망의 언어다. (전 수원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