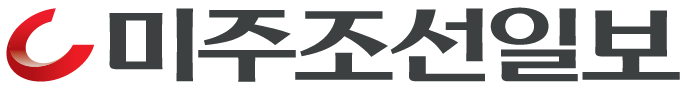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이우근 칼럼] 법의 문 앞에서
이 우 근
변호사/ 숙명여대 석좌교수
PEN.KOREA 인권위원장
한 시골 사내가 법의 문 앞에 도착한다. 그는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덩치 큰 문지기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사내는 문지기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마냥 기다린다. 그는 문지기에게 애걸도 하고 뇌물도 주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문지기는 "문 안에 또 다른 문들이 있으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늙고 쇠약해진 사내는 마지막으로 문지기에게 묻는다. “모든 사람이 법의 문이 열리기를 애타게 바라는데, 오랜 세월 동안 왜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았는가?” 문지기가 대답한다. “이 문은 오직 너만을 위한 문이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소설 <소송>의 '성당에서'라는 장에 삽입된 <법 앞에서>라는 짧은 이야기의 줄거리다. 법대를 졸업한 카프카는 법을 소재로 여러 편의 글을 썼는데, <법 앞에서>의 법은 실정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조리하고 불투명한 현실의 세계, 인간 실존과 관료주의적 귄위의 갈등 같은 주제를 짧은 이야기 속에 폭넓게 담고 있다.
여기서 법은 사법제도를 넘어 신성한 진리, 초월과 구원 등을 상징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송에 휘말려 무죄를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송>의 주인공 카(K)는 성당 신부로부터 <법 앞에서>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법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골 사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사내는 문지기를 밀쳐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권위에 복종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한다. 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스스로 지워버린 삶의 실패였다. 그 실패는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를 포기한 자신의 선택 때문이며, 결국 자유의지의 책임이었다. 법은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법의 정의는 기어이 도달하지 못하는 환상으로 남아 있다. 법의 구원은 늘 곁으로 미끄러지고, 현실 속에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구원과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 부조리한 세계다.
우리 삶이 그렇다. 진실은 거짓 앞에서 언제나 밀려나고, 구원을 향한 기대는 항상 좌절을 겪을 뿐이다. 법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지기에 막힌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인가, 문지기와 투쟁하며 그를 밀쳐내고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오늘날에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법정으로 떠넘겨지기 일쑤이고, 반면에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마냥 지연되기만 한다. 여론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관선거제도를 배제한 사법부가 도리어 법리적 정당성보다 여론의 향방이나 정치적 압력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듯하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반대방향으로 치닫는다. 법관이 법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문지기나 다름없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이념적 분열이 거세지면 재판의 신뢰성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제 나는 이 문을 닫는다.” 문지기가 시골 사내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사내의 좌절을 더욱 아프게 찔러댄다. 그것이 민초들의 운명이라면, 더할 수 없는 절망일 것이다. 사내는 자신만을 위한 법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 법의 문, 진실과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지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문지기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법의 본분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체제의 수호자일 뿐이다. 법의 수호자는 국민이고 민초들이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때 민초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지기를 밀어내고 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야 한다. 문지기는 법의 문을 막는 이유를 “네가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사내의 귀에 속삭인다. 어쩌면 문지기도 속마음으로는 사내가 자기를 밀쳐내고 법의 문 안으로 발 내딛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사법부의 법관들 역시 국민이 법의 정의를 포기하지 않기를, 꿋꿋한 민초들이 스스로 법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