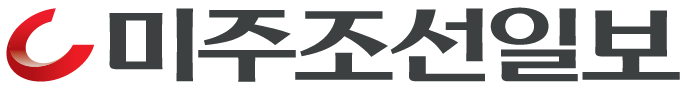[이만훈의 속닥속닥] 칠월칠석 회상
# 참, 알 수가 없다. 자연의 신비를-. 이 땅의 뭇 생명들을 태워 없애버릴 듯했던 맹렬더위의 기세가 말복을 고비로 이리 급히 고꾸라지다니 말이다. 하기야 입추에 처서까지 지났고, 음력 칠월하고도 하순이니 오동잎이 지지 않아도 이미 가을 자락에 들어선 게 아니랴. 매년 칠월이 되면 늘 기억의 저편에 잠겨있던 두 가지가 새삼 떠올려지곤 하는데, 바로 이육사(李陸史 · 1904~44)의 그 유명한 ‘청포도’란 시(詩)와 칠석(七夕)명절이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로 시작되는 시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게 시의(詩意)라는데, 그것보담 미려하면서도 정감어린 어투로 고향을 듬뿍 안겨주는 마음 씀씀이에 반해 고교시절부터 한동안 입에 달고 다니던 노래이자 영혼에 걸어둔 한 폭의 그림이었다.
# 육사에게 칠월은 청포를 입은 손님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한껏 부푸는 달이지만, 원래 이 땅의 민초들에게 칠월은 아주 오래된, 애틋하기 그지없는 로망스의 기억이다. 그것은 칠월 칠일 칠석날 벌어지는 천상의 드라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일 년에 이날 단 하루만 만남이 허락되는 견우와 직녀-. 그래서일까, 칠석날 전후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일이 많다. 이날 오는 비가 ‘칠석우(七夕雨)’인데,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수레 준비를 하느라고 먼지 앉은 수레를 씻기 때문이라며 이 비를 ‘수레 씻는 비’, 즉 세차우(洗車雨)라고도 했다. 또 이 날 오는 비는 그들이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며,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해 ‘눈물 흘리는 비’, 곧 쇄루우(灑淚雨)라고도 한다. 북한에 있는 강서 덕흥리 고구려 고분벽화(408년)에 은하수 사이에 견우와 개를 데리고 있는 직녀의 그림이 있는 점으로 미뤄 우리나라에선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칠석문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석은 북두칠성에서 비롯된 칠성신앙과 섞여 민간에선 묘하게 ‘비나리’ 명절이기도 했다.
# 칠석날은 바빴다. 어머니는 신새벽부터 밭머리 풀숲 광을 뒤져 애호박을 한 소쿠리 넉넉하게 딴 뒤 오는 길에 적당히 약이 오른 고추며 너울너울 보기 좋게 자란 부추도 챙겨서는 조반(朝飯)이 끝나기 무섭게 소당질을 준비하셨다. 여름철 내내 부엌 대신 한데서 화덕에 밥을 지어 먹기는 했지만 소당질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 무릎높이 맞춤으로 적당한 돌 세 덩이를 세모꼴로 편평하게 늘어놓은 뒤 작은 솥뚜껑을 뒤집어 올리면 준비 끝이었다. 소당질용 임시 아궁이는 늘 그렇듯이 뒤꼍에 차려졌다. 오래 묵은 철쭉나무 밑 둔덕에 성주단지가 있고, 그 밑에 장독대가 자리한 옆으로 열 길쯤 되는 감나무와의 사이가 바로 그 자리였다. 어머니는 커다란 양푼에 묽게 푼 밀가루 풀죽을 가득 채워 놓고, 그 옆에는 정갈하게 다듬은 부추다발과 알맞게 썬 고추오라기를 놓아두시곤 이내 아궁이에 불을 붙이셨다. 바짝 마른 소나무 장작에 불이 붙어 솥뚜껑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솔잎으로 들기름을 두른 뒤 호박꼭지로 얇게 문질러 펴면서 열기를 가늠하셨다. 웬만큼 됐다싶으면 국자로 밀가루 풀을 떠서 지글거리는 기름 위에 얇게 펴는 순간 솥뚜껑 위에선 갑자기 양철지붕에 소나기 쏟아지는 듯이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울 밖까지 진동하는 고소한 내음 속에 노릇노릇한 누름적이 고운 자태를 들어내게 마련이었다. 한 장을 부치는데 고작 몇 초도 안 걸렸다. 가뜩이나 아직 더위가 남아있는데다 불까지 피워대니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다 연기에 찔려 찔끔거리는 눈물까지 범벅이지만 어머니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연신 신공(神功)을 발휘하시곤 했다. 아무 것도 안 집어넣은 소적(素炙·맨 누름적)은 고사용이라 먼저 부치고, 이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추적, 그리고 맨 나중에 나머지 식구들 몫인 부추적을 부치셨다. 예전엔 부치개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법도가 있었다. 식구가 많은데다 명절음식은 이웃에 도르는 법이어서 대충 광주리로 하나 가득 채우고서야 어머니는 허리를 펴실 수가 있었다.
# 작품(?)을 만드시는 게 어머니 몫이라면 이 작품을 가지고 칠성님께 비는 것은 할머니의 사명이요 권한이었다. 칠성님은 용왕님과도 통하는 대표적인 ‘수신(水神)’이라 제일 먼저 우물에 치성을 드리는 게 이날 고사의 포인트이다. 어머니께서 빚으신 누름적 중에서도 기중 잘 생긴 놈으로 세 장을 골라 깨끗이 닦은 목판에 담은 뒤 소반에 받쳐 들고 우물에 가져다 놓고는 할머니의 거룩한 비손이 시작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일월성신 하지후토 제천제불 팔금강 님께 비나이다~”로 시작되는 할머니의 축원은 서른 여남은이나 되는 자손들을 일일이 한 명씩 불러대며 모두가 무탈하고 잘 되길 비는 것이었다. 언문도 못 깨쳐 일자무식이었지만 어디서 배우셨는지 주문을 외우시며 연신 손을 비비고 허리를 숙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이 세상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양귀비꽃 보다 더 붉은 종교심’ 그 자체였다. 평생 농사일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손과 손 사이에서 나는 “서걱서걱” 소리가, 무엇엔가 목이 메어 반쯤 잠긴 듯 갈라진 목소리와 섞여 우물물 위에 묘한 파문을 일으키던 할머니의 영검스런 존영(尊影)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물에 이어 성주에, 그리고 장독대 위 정화수(井華水)에, 부엌 조왕(竈王)과 뒷간 신(廁神)에게까지 이어지는 할머니의 치성이 끝나야 누름적을 먹을 수 있었으니 어린 마음에는 꽤나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 조각 입에 넣었는가 싶기 무섭게 형, 동생과 함께 건너 마을까지 누름적을 도르느라 정신이 없다보면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곤 했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논두렁을 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며 젖빛으로 흐르는 은하수 사이에서 견우와 직녀를 찾고 손가락으로 북두칠성을 그려보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이만훈 칼럼니스트: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한국 중앙일보에서 경찰, 국방부 출입 등 사회부기자를 거쳐 문화재 및 인터뷰 전문기자를 지냈다. 향수를 자극하는 사투리나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탁월하고 유려한 문장을 더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 소개 등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